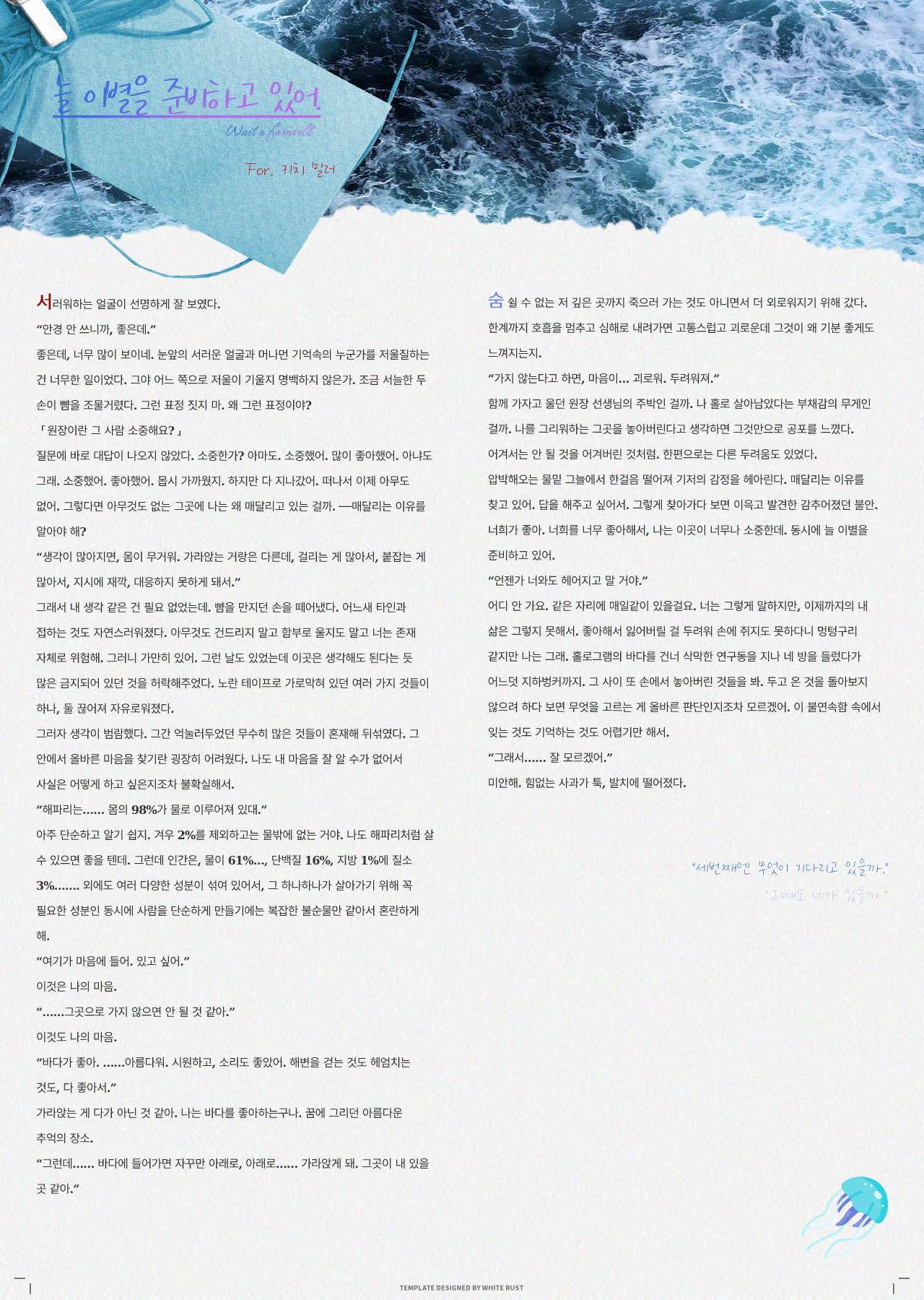2챕 개인로그 더보기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된다.」」 지평선 너머로 타오르듯 붉은 해가 떠오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이라면 움직여도 되겠지. 기실 불침번은 유명무실했다.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도 굳이 피곤을 무릅쓰고 깨어 있던 건 꿈속에서는 네 숨소리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들려오는 목소리, 나지막한 호흡, 박동. 오르내리는 가슴. 어둠속에서 그런 것들을 살피다 보면 새벽은 금세 걷혔다. 모래밭을 지나 느릿하게 걸음을 옮긴다. 그 사이 몇 번이나 오간 덕에 호수를 찾기란 어렵지 않았다. 손을 살짝 담그자 새벽 공기 덕인지 시리도록 찼다. 잠을 깨운다. 「발만 담그고 와.」 노먼은 수영을 안 해봐서 그래. 어차피 담글 거면 발이든 몸이든 별 차이 없는데. 당사자가 들었으면 기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