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린도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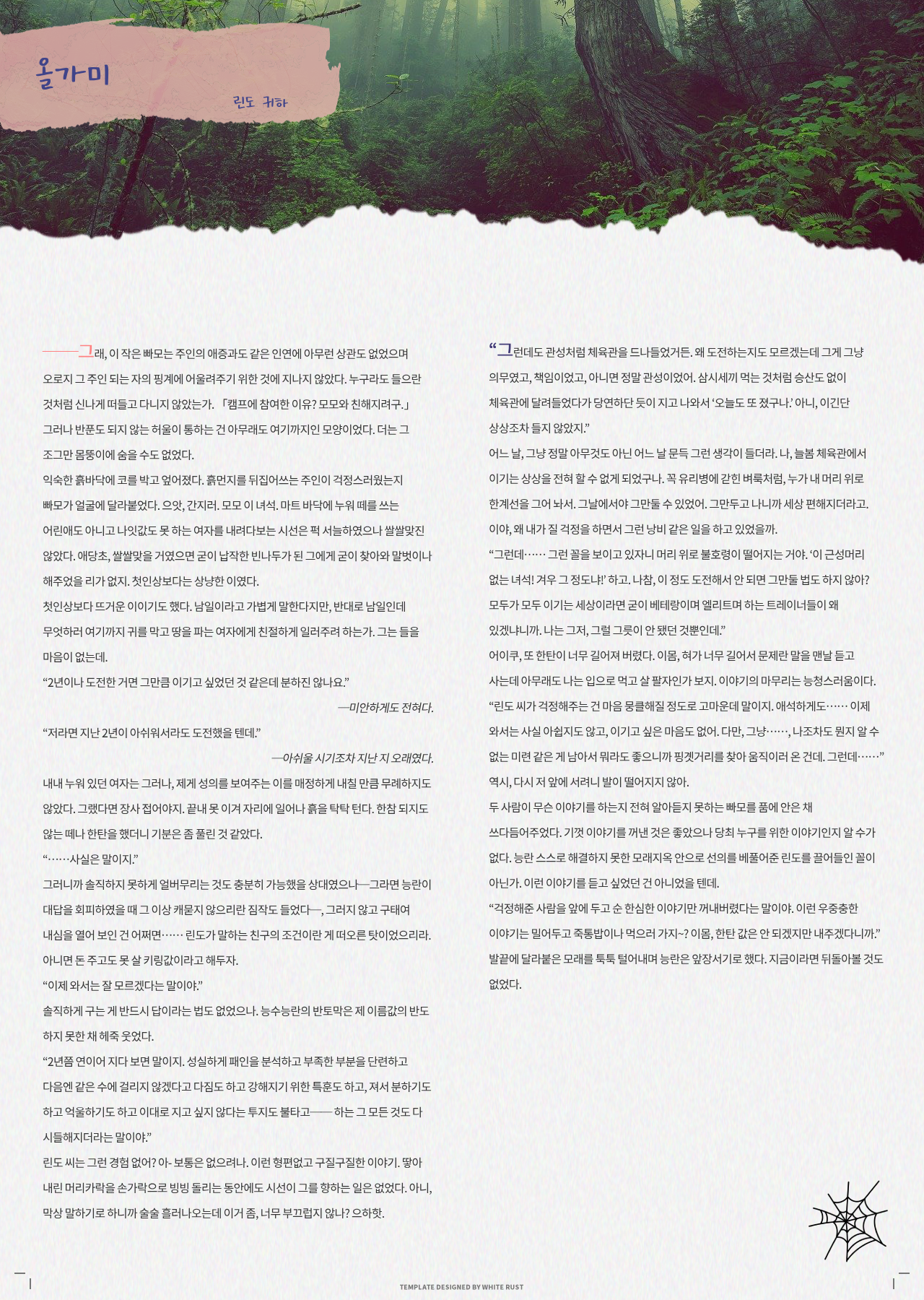
──그래, 이 작은 빠모는 주인의 애증과도 같은 인연에 아무런 상관도 없었으며 오로지 그 주인 되는 자의 핑계에 어울려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누구라도 들으란 것처럼 신나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는가. 「캠프에 참여한 이유? 모모와 친해지려구.」 그러나 반푼도 되지 않는 허울이 통하는 건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모양이었다. 더는 그 조그만 몸뚱이에 숨을 수도 없었다.
익숙한 흙바닥에 코를 박고 엎어졌다. 흙먼지를 뒤집어쓰는 주인이 걱정스러웠는지 빠모가 얼굴에 달라붙었다. 으앗, 간지러. 모모 이 녀석. 마트 바닥에 누워 떼를 쓰는 어린애도 아니고 나잇값도 못 하는 여자를 내려다보는 시선은 퍽 서늘하였으나 쌀쌀맞진 않았다. 애당초, 쌀쌀맞을 거였으면 굳이 납작한 빈나두가 된 그에게 굳이 찾아와 말벗이나 해주었을 리가 없지. 첫인상보다는 상냥한 이였다.
첫인상보다 뜨거운 이이기도 했다. 남일이라고 가볍게 말한다지만, 반대로 남일인데 무엇하러 여기까지 귀를 막고 땅을 파는 여자에게 친절하게 일러주려 하는가. 그는 들을 마음이 없는데.
“2년이나 도전한 거면 그만큼 이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분하진 않나요.”
미안하게도 전혀다.
“저라면 지난 2년이 아쉬워서라도 도전했을 텐데.”
아쉬울 시기조차 지난 지 오래였다.
내내 누워 있던 여자는 그러나, 제게 성의를 보여주는 이를 매정하게 내칠 만큼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랬다면 장사 접어야지. 끝내 못 이겨 자리에 일어나 흙을 탁탁 턴다. 한참 되지도 않는 떼나 한탄을 했더니 기분은 좀 풀린 것 같았다.
“……사실은 말이지.”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게 얼버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상대였으나─그라면 능란이 대답을 회피하였을 때 그 이상 캐묻지 않으리란 짐작도 들었다─, 그러지 않고 구태여 내심을 열어 보인 건 어쩌면…… 린도가 말하는 친구의 조건이란 게 떠오른 탓이었으리라. 아니면 돈 주고도 못 살 키링값이라고 해두자.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이야.”
솔직하게 구는 게 반드시 답이라는 법도 없었으나. 능수능란의 반토막은 제 이름값의 반도 하지 못한 채 헤죽 웃었다.
“2년쯤 연이어 지다 보면 말이지. 성실하게 패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단련하고 다음엔 같은 수에 걸리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고 강해지기 위한 특훈도 하고, 져서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대로 지고 싶지 않다는 투지도 불타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시들해지더라는 말이야.”
린도 씨는 그런 경험 없어? 아- 보통은 없으려나. 이런 형편없고 구질구질한 이야기. 땋아 내린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는 동안에도 시선이 그를 향하는 일은 없었다. 아니, 막상 말하기로 하니까 술술 흘러나오는데 이거 좀, 너무 부끄럽지 않나? 으하핫.
“그런데도 관성처럼 체육관을 드나들었거든. 왜 도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의무였고, 책임이었고, 아니면 정말 관성이었어.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승산도 없이 체육관에 달려들었다가 당연하단 듯이 지고 나와서 ‘오늘도 또 졌구나.’ 아니, 이긴단 상상조차 들지 않았지.”
어느 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 늘봄 체육관에서 이기는 상상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구나. 꼭 유리병에 갇힌 벼룩처럼, 누가 내 머리 위로 한계선을 그어 놔서. 그날에서야 그만둘 수 있었어. 그만두고 나니까 세상 편해지더라고. 이야, 왜 내가 질 걱정을 하면서 그런 낭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꼴을 보이고 있자니 머리 위로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야. ‘이 근성머리 없는 녀석! 겨우 그 정도냐!’ 하고. 나참, 이 정도 도전해서 안 되면 그만둘 법도 하지 않아? 모두가 모두 이기는 세상이라면 굳이 베테랑이며 엘리트며 하는 트레이너들이 왜 있겠냐니까. 나는 그저, 그럴 그릇이 안 됐던 것뿐인데.”
어이쿠, 또 한탄이 너무 길어져 버렸다. 이몸, 혀가 너무 길어서 문제란 말을 맨날 듣고 사는데 아무래도 나는 입으로 먹고 살 팔자인가 보지. 이야기의 마무리는 능청스러움이다.
“린도 씨가 걱정해주는 건 마음 뭉클해질 정도로 고마운데 말이지. 애석하게도…… 이제 와서는 사실 아쉽지도 않고,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 다만, 그냥……, 나조차도 뭔지 알 수 없는 미련 같은 게 남아서 뭐라도 좋으니까 핑곗거리를 찾아 움직이러 온 건데. 그런데……”
역시, 다시 저 앞에 서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빠모를 품에 안은 채 쓰다듬어주었다. 기껏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좋았으나 당최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 능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모래지옥 안으로 선의를 베풀어준 린도를 끌어들인 꼴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
“걱정해준 사람을 앞에 두고 순 한심한 이야기만 꺼내버렸다는 말이야. 이런 우중충한 이야기는 밀어두고 죽통밥이나 먹으러 가지~? 이몸, 한탄 값은 안 되겠지만 내주겠다니까.”
발끝에 달라붙은 모래를 툭툭 털어내며 능란은 앞장서기로 했다. 지금이라면 뒤돌아볼 것도 없었다.
이후에 사고 치고 친구에게 멸시받으며 짜릿하고 괴로워하기
'포켓몬스터 : 피치럼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07) 09.28. 수리 박사님의 특훈!! -1- (0) | 2023.12.26 |
|---|---|
| 006) 09.26. 방방곡곡 파도치리라 (0) | 2023.12.26 |
| 004) 09.23. 선배의 경험담 (0) | 2023.12.26 |
| 003) 09.21. 시기적절 (0) | 2023.12.26 |
| 002) 09.18. 출사표 (0) | 2023.12.26 |